“김용균법·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노동자 안전 외면한 결과”“원청 책임 회피와 비용 절감만 앞세운 ‘안전 불감증’이 또 한 명의 목숨 앗아가”
-

- ▲ 2023년 1월 8일 화재 발생당시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모습.ⓒ충남소방본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그곳에서, 지난 2일 또 한 명의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으로 방치된 노동자 안전 문제와 법·제도의 무력화에서 비롯된 필연적 참사다.태안화력발전소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동일한 구조적 병폐가 작동하고 있다. 원청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논리에 매몰되어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한, 하청 노동자들은 언제나 희생양일 뿐이다. ‘2인 1조 근무’는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 구호에 불과하며, 안전 매뉴얼은 현실과 동떨어진 장식품일 뿐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이 법은 원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준다. 그 결과, 원청 기업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며, 재해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떠넘기려 한다. 이 현실은 참담하고 분노를 자아낸다.진보당이 지적했듯,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과 비용 절감 중심의 기업 문화가 빚은 참사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한, 우리의 산업현장은 끔찍한 재해의 현장으로 남을 것이다.이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원청 기업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법률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개혁이 시급하다.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우리는 다시는 김용균 씨와 또 다른 희생자들이 반복되는 참혹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안전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절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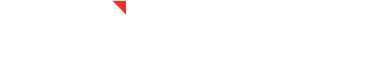






![[단독] 증평 ‘영뜰회’ 지방선거판 '뇌관'으로 부각](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thumb/2026/01/26/2026012600356_0_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