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예약까지 받아놨는데, 카드가 결제 거부”“그날 이후 손님도, 신용도 다 끊겼어요.”
-

- ▲ 김경태 선임기자.ⓒ뉴데일리
대전 서구에서 1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선미(가명·46) 씨는 고정비 감당을 위해 써온 신용카드가 연체돼 사용하던 모든 카드가 정지됐고, 급기야 사채까지 손댔으나 몇 개월 버티지 못해 결국 폐업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문을 닫았다.박 씨는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배출을 견디기 위해 카드사 세 곳에서 개인카드를 발급받았다.“처음엔 사업자라 한도 우대가 가능하다”는 카드사 직원의 말을 믿었고, 실제로 카드 사용으로 재료비도 조달하며 버틸 수 있었고, 매출이 조금 나아질 때는 결제에도 문제가 없었다.문제는 작년 겨울부터다. 전기요금과 임대료가 오르자, 카드 최소 결제금조차 버거워졌고, 연체가 발생하자 한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다른 카드사들도 연체정보를 공유받고 줄줄이 정지 통보를 해왔다.“카드 하나 연체했는데 나머지 카드가 다 막히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숨 좀 돌릴 여유만 있었어도 안 망했을 거예요.”박씨는 급기야 대부업체를 찾았고, 하루 이자가 2만 원이 넘는 돈을 쥐고 다시 카드 연체를 막았지만, 그 선택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마음도 의혹도 무너져 결국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지방 부모 집으로 내려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 빚 탕감’을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박씨 같은 이들은 그 손길이 닿기 전, 조용히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다.박씨의 퇴장 배경에는 실시간 연체정보 공유, 일괄 정지 시스템, 불투명한 신용등급 평가 체계도 한몫했을 것이다.카드사의 연체정보 공유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부실 위험 차단’과 ‘건전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설명된다. 하지만 실제론 카드사 간 손실 최소화와 이익 보전을 위한 구조라는 비판이 지배적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조해 온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카드사는 언제나 ‘사업자 우대’, ‘맞춤 혜택’이라며 손을 내민다. 하지만 연체가 발생하는 순간, 그 손은 누구보다 먼저 거둬지는 양면성이 존재한다.카드는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기에 그 빚도 쉽게 늘어나지만, 그 빛에서 탈출하지는 너무나 어려웠다.이것이 신용사회의 민낯이고, 소상공인의 비명이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조용한 실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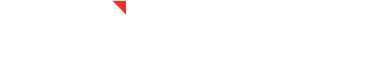






![[단독] 증평 ‘영뜰회’ 지방선거판 '뇌관'으로 부각](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thumb/2026/01/26/2026012600356_0_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