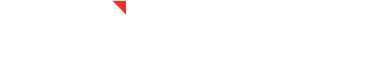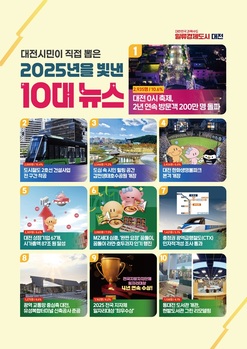“다문화는 현실이다” — 250만 외국인 시대, ‘정책은 아직 제자리’‘동화’가 아닌 ‘공존’의 틀로… 포용적 다문화 사회 위한 대전환 절실
-

- ▲ 김경태 선임기자.ⓒ뉴데일리
글로벌화가 일상이 된 시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문화 국가가 아니다. 고려시대 유민 수용부터 시작된 이질적 문화의 포용 역사는 오늘날 250만 외국인이 체류하는 다문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 약 20만 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가 통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총인구가 약 200만 명이던 시절, 이는 10%에 달하는 거대한 사회 변화였다. 당시의 포용과 통합 전략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다문화 사회의 고민에 시사점을 준다.1960년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 1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다. 도시화와 산업 발전은 결국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를 뒤바꿨고, 199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한국 사회 구성의 다변화가 본격화됐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50만 명,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한국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 되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건설, 제조, 농업 등의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관광, 무역 등 서비스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유입은 우리 사회를 더 글로벌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사회의 안착을 막는 걸림돌은 적지 않다.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 일자리 경쟁,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의 정책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에 한정돼 있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은 여전히 제도의 외곽에 머물러 있다.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외국인을 한국 사회에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포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이다.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이제 ‘다문화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교육, 노동시장 구조, 법·제도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한국에 맞추는 것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때다.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단일한 색깔이 아니다.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제는 그 현실을 품을 수 있는 정책과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