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은 쓰는 것이 아니고 줍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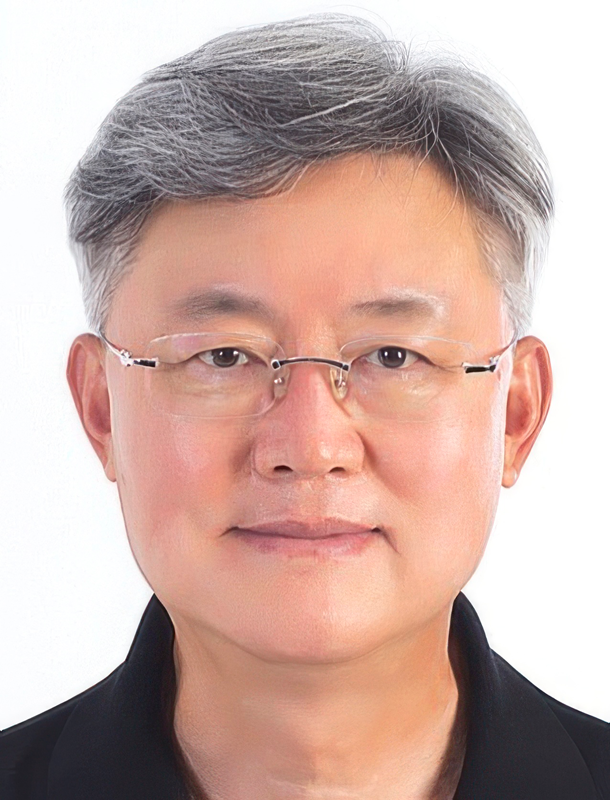
- ▲ 이재룡 칼럼니스트.ⓒ이재룡 칼럼니스트
글은 쓰는 것이 아니고 줍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버려진 신문, 헌책, 길거리에 즐비한 간판, 국밥집 아줌마의 일그러진 하소연, 고물상에 나뒹구는 페트병, 플래카드, 버스에 붙은 광고 시트지, 병원 처방전에 인쇄된 약품 이름들까지 넝마주이가 되어 커다란 망태기에 그저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글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고물상에 내다 팔기 전에 쓸만한 물건들만 골라 옮겨 담았습니다. 하기야 손수레로 한가득 가져다 줘봐야 고작 50㎜ 요구르트 한 병과 삼양라면 두 봉지를 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손수레가 계근장에 올라서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두근거립니다. 그러고는 저울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뻐근해집니다.뉘는 봄이 오면 벚꽃 구경 간답시고 잰걸음으로 관광버스에 오르고, 뉘는 아스팔트가 검정 고무신에 쩍쩍 눌어붙는 뜨거운 여름날이 되면 천렵한다며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서고, 뉘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단풍놀이 짝짓기한다며 ‘시장표 나이카 운동화’, ‘아디도스 츄리닝’, ‘노쓰파쓰 등산복’으로 한껏 치장하고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쏟아내는 껄렁한 트로트 음악에 몸을 흔든다.뉘는 손에 쇠꼬챙이 두 개를 들고 발에는 널빤지를 묶고는 겨우내 칼바람이 부는 산등성이에서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리꽂으며 야호를 연발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망태기를 어깨에 걸머지고 길을 나섭니다. -

- ▲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재룡 칼럼니스트
넝마주이는 저만치 버려진 몹쓸 놈의 고물일지라도 고개를 쭉 빼고 유심히 쳐다보면 돈이 되는 놈인지 안 되는 놈인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주워 담은 고물을 분리할 때가 첫 번째 행복입니다. 분리한 고물을 싣고 고물상으로 갈 때가 두 번째 행복입니다.가장 귀한 고물은 팔지 않고 만지작거립니다. 만지작거리면 거릴수록 꼬질꼬질한 손때에 절어, 되려 반들반들 윤이 납니다. 넝마주이는 한참 동안 마당에 쏟아놓은 고물을 물끄러미 째려보는가 싶더니 망태기에 주워 담았습니다.망태기에 담겨있는 고물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망태기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식자재 삼아 고물을 덤덤하게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침을 묻히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도록 깜찍하고 겸손한 글로 만들어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펼쳐봅니다.망태기 걸머지고 길을 보챕니다.2024년 5월 9일. 글은 만지작거릴수록 반짝입니다. 이재룡 빛바랜 책상머리에 앉아 버려진 고물을 주워 만지작거립니다.







![[르포]](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thumb/2026/03/03/2026030300026_0_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