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놈펜에서 만난 사람들’: 프놈펜의 밤은 짓궂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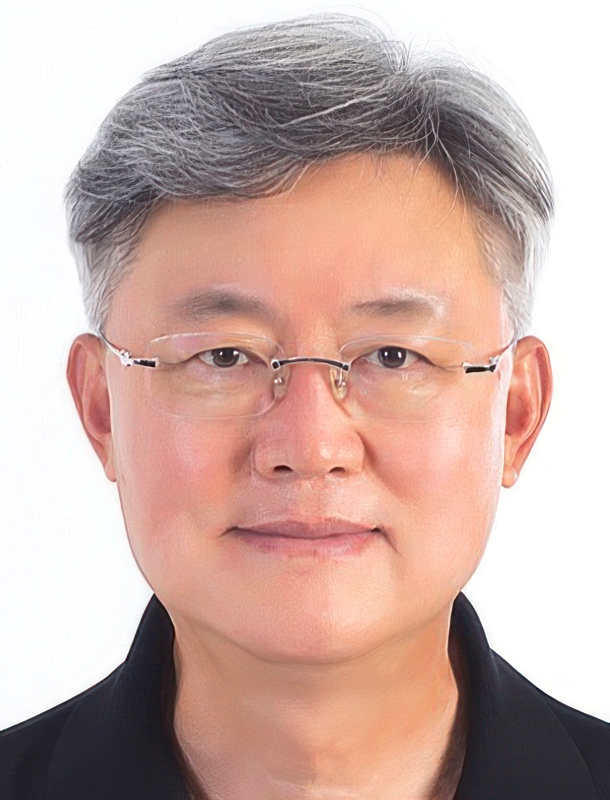
- ▲ 이재룡 칼럼니스트.ⓒ이재룡 칼럼니스트
프놈펜에서 가장 높다는 건물 Morgan 48층 제일 꼭대기 층 스카이바 ‘La Vida’에 가면 빤 지름 한 인도차이나 뱀이 우글댄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뒤도 안 돌아본 채 230m 올라와 로컬 뱀들을 유인하려는 흑심을 품고 ‘간지나게(멋지게)’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독을 잔뜩 품은 프놈펜 야행성 뱀들이 제 잘난 멋에 취해 옆에 달린 눈을 반쯤 게슴츠레 뜨고 몸을 비비 꽈가며 술잔을 기울인다. 난리 법 구석 떨고 가관도 아니다.로컬 땅꾼들도 가우 떨어질세라 괜한 소리도 지르고 추파를 던진다. 때마침 눈치 빠른 운전기사 Suy Tha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한다. 바로 뒤에 Morgan 건물주가 고위급 경찰 간부와 앉아 있다. 아마도 아가리 닥치고 조심조심 놀다 가라는 경고를 돌려 말하는 것 같았다. 즉각 답을 보냈다. 지금 이 자리는 돈과 권력이 아닌 자유일 뿐이다. 젠장 ‘개 무시’하고 라이브 싱어에게 Eagles ‘Hotel California’ 신청곡을 던졌다. 싱어는 조선의 땅꾼들을 위해 기타를 긁는다. 그런데 이 노래를 처량하고 애절하게 부른다.자유는 갈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오늘 밤 미치도록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 밤이 지워지지 않도록 지새우고 싶다. 행여 아침이 온다 해도 잠에서 깨질 않고 싶다. 이도 저도 아니면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싶다. 그리움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곁에서 숨 쉬고 싶다. 행여 그리움이 떠난다 해도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 프놈펜의 밤은 짓궂다. 그렇게 프놈펜 구석구석 갈증이 밤부터 시작된다. -

- ▲ 프놈펜 사원.ⓒ이재룡 칼럼니스트
늦잠을 깨우려 아침이 스멀스멀 다가와 후끈 달아오르는 계절풍을 뿌린다. 평온한 ‘돈레샵강’을 끼고 북으로 40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250년간 크메르 왕조의 고대수도 ‘우동(Oudong)’이다. 1866년 어느 날 노로돔 왕(재위 1860∼1904)은 우동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채 프놈펜으로 천도를 한다. 태국과 베트남 틈바구니에서 연신 ‘꿍따리 샤바라’에 놀아나며 왕위를 이어간 캄보디아는 위태로운 왕권사수를 위해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다.또한, 국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엄청난 땅을 태국과 베트남에 공짜로 떼어줬다. 거저 준 땅은 대박 나는 알짜배기였다. 이도 불안했는지 프랑스 식민지를 자처한다. 왕도 사람인지라 백성들 볼 낯이 부끄러웠는지 헌법 제7조에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열한 글자를 슬쩍 집어넣었다.우동에서 부처는 신이 아니었다. 우동에서 만큼은 무거운 물건을 거리낌 없이 들어주는 옆집 아저씨 때로는 말동무를 서슴지 않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였다. 부침이 많은 나라 캄보디아 우동사원 불탑에 걸린 국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왕권의 안위를 위한 할지, 왕권의 수호를 위한 식민지, 왕권의 보호를 위한 도피(망명)가 만들어 낸 캄보디아 왕들의 반란으로 애꿎은 백성만 길거리로 나앉았다. 캄보디아 국기 변천사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 ▲ 이재룡 칼럼니스트가 프놈펜 전통시장에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이재룡 칼럼니스트
우동 바자르 신작로 횡단보도를 반듯하게 걷는다.2024년 4월 22일. 사흘 동안 발품 팔아 모은 캄보디아 속속들이 파헤치기를 한 곳에 몰아 프놈펜 독립기념탑 기둥에 붙인다. 저만치 노로돔 시아누크 동상이 보인다. 이재룡 계절풍에 핀 땀을 말려 글로 뿌린다.







![[르포]](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thumb/2026/03/03/2026030300026_0_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