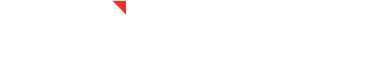-
-

- ▲ ⓒ최종웅 작가
최백수는 병을 진단하기 위한 허실(虛實) 판단을 저수지의 물에 비유하면 알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수지의 물은 언제나 알맞게 있는 게 이상적이다. 물이 너무 많으면 둑이 터질 위험이 있고, 물이 너무 적으면 가뭄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위험이 있을 때는 물을 빼어주는 걸 사침(寫針) 즉 승격(勝格)이라고 한다면, 물이 너무 없어서 물을 더해주는 것을 보침(補針) 즉 정격(正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침(寫針)을 놓을 건지, 보침(補針)을 놓을 건지는 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걸 한방에서는 진단이라고 한다. 침을 놓으면서 진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허실(虛實)을 판단하는 것이다. 보침을 놓을 것이냐, 사침을 놓을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칫 진단을 잘못해서 보침을 놓을 것을 사침을 놓는다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다.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악화시키는 것은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원망을 듣는 게 아니라 민형사적인 책임을 추궁 당할 수도 있다. 침술공부를 한다는 건 바로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최백수는 지나온 세월을 회상해 본다. 초보시절엔 이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 그만큼 임상경험이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승(勝)한 것을 사(寫)해 주는 사침(寫針)의 원리는 무엇일까?”
최백수는 또 중얼거린다.
“자사관보(子寫官補)
자식을 사(寫)하고 관을 보(補)한다는 뜻이다.보침의 원리와 정반대다. 보침에서는 어미를 보하고 관을 사했지만, 사침에서는 자식을 사하고 관을 보하는 것이다. 최백수는 또 의아하다는 생각을 한다. 승한 것을 사하려면 직접 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식을 사하는 걸까?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사암오행침의 원리가 다분히 여성적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어미에게 자식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자식 없는 어미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가. 이보다 더 슬픈 게 자식을 잃은 어미다. 자식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보통 잃었다고 말한다. 죽은 자식을 땅에 묻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가슴에 묻는다고 말한다. 결국 어미에게 자식은 자기 몸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약하게 만들면 힘을 잃는다는 원리를 침에 도입한 것이다. 얼마나 여성적인 침인가? 얼마나 모성본능을 잘 이용한 것인가?
이게 바로 사암오행침의 정승격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침은 누가 만든 것일까? 왜 이 침을 사암오행침이라고 부르는 걸까? 최백수는 벌떡 일어서다니 책장 앞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갈 수가 없다. 손발에 4방의 침을 꽂은 상태다. 그러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안갈 수도 없다. 궁금증이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렇게 신비한 침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
이런 호기심이 마음을 뜨겁게 달군다.최백수는 엉금엉금 기어서 책장 앞으로 간다. 그 많은 침술서적 중에 딱 한 권을 빼든다. 그의 예상대로 그 책 속에 답이 나와 있다. 최백수는 호기심을 갖고 읽기 시작한다.
“사암도인을 아는가? 동의보감의 허준, 사상의학의 이제마와 함께 조선 3대 명의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사암오행침이란 독특한 침술을 창안한 전대미문의 의학자지만 행적은 물론 본명, 태어나고 생을 마감한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우리가 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의서 '침구요결'에 적힌 사암도인이라는 호칭뿐이다. 소설 '침객'의 지은이는 침구요결의 행간에서 사암도인의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암도인을 생명의 이치에 눈 뜨고, 의술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개혁가로 재탄생시켰다. 소설 속 사암은 결국 이름 없는 떠돌이 의원, 곧 침객으로서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의 곁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뿐이다. 사암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다. 최백수가 궁금해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마음을 안도케 하는 구절이 하나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암도 떠돌이 침술가였다는 사실이다.최백수는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돌팔이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뭐가 부끄러운가. 명칭이야 어떻든, 자격증이야 있든 없든 간에 병만 잘 고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최백수의 눈엔 졸음이 가득하다.
어느새 반쯤 눈이 감겨있다. 사암도인이 창안했다는 오행침의 효과가 전신에 퍼지고 있는 증거다. 침 한 방에 발바닥의 통증도 감소하고 불면증도 치료한 것이다. 최백수는 잠결에 침관을 들고 전국을 유랑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거기에 탁구 라켓 하나를 더 들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운동도 하고 침도 놓는 삶을 상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든다. (계속)
최종웅의 소설식 풍자칼럼 ‘사랑 타령(55)’
조선의 3대 명의 사암(舍岩)은 누구인가?
- 최종웅 교수
입력 2016-03-26 14:49수정 2016-03-26 15:17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성도 이름도 모르는 돌팔이 침객
최종웅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