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놈펜에서 만난 사람들’ “‘크메르 제국’ 환상서 허우적…수십년 전 우리도 같은 길 걸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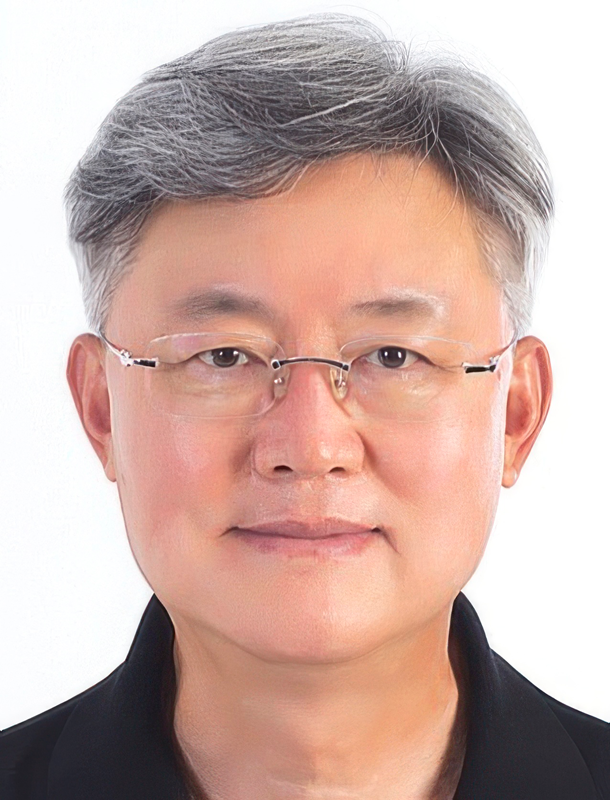
- ▲ 이재룡 칼럼니스트.ⓒ이재룡 칼럼니스트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나간다. 참담하게 구겨졌다. 나름 철 지난 ‘크메르 제국’의 환상에서 허우적댄다고 해야 적확한 표현일까?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도 같은 길을 걸었다. 반듯한 신작로 하나 없이 흙먼지 옴팡(죄다) 뒤집어쓰며 발가락이 비집고 나온 검정 고무신 한 켤레 신고 이 길을 걸었다. 누가 그러더라. 모르면 죄가 될 수도 있다? 자유를 모르고 희망을 모르고 정의를 모르니 꿈을 꿀 이유가 없다? 구겨진 종이에 꿈을 적어 복사기에 넣어 보지만 걸려서 나오질 못한다. 다리미로 구겨진 종이를 아무리 펴 본들 또 걸린다.국경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와는 무관한 단어 같기도 하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둥글넓적한 칠면조처럼 생긴 만큼 14개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국경선을 넘고자 하는 외국인은 상대국의 출입국 허가를 받아 들락거릴 수 있다. 굳게 닫혀 있지만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 국경선이다.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예도 있으나 영해의 경계는 존재한다. 국경선을 통과하면 입국 내지는 출국이라 한다.우리에게 국경선이란 무엇일까? 좀 생소하다. 1984년 우리 손으로 만든 ‘포니2’ 현대자동차를 타고 국경선을 넘어 북한 가는 꿈을 꾸었다. 대가리가 좀 더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경선이 아니고 경계선이었다. 지금은 꽉 막힌 남북관계지만 한때 사이가 좋아 퍼주기 바빴던 때 개성이나 금강산 여행을 갈라치면 출경 또는 입경이라 했다.프놈펜에서 21번 국도에 올라 남쪽으로 1시간여를 내 달려 베트남과 국경도시 ‘Chery Thum’에 도착했다. 휑한 길 위에 덜렁 가로 세워진 바리케이드 하나가 국경선 전부인 양철 지붕 출입국관리소가 자유롭다. 동서로 길게 238㎞의 군사분계선이 높은 철책으로 설치된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1953년 7월 27일 22시 이후론 그 누구도 넘나들 수 없는 고통과 통곡의 경계선이 여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실로 국경이 없는 섬나라가 분명하다. 구겨진 종이처럼 살아온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

- ▲ 허술한 국경 검문소.ⓒ이재룡 칼럼니스트
칠면조의 나라 중국이 피를 토하고 있을 때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멋진 사나이 안중근은 이토 심장에 총알을 꽂으며 울부짖는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독립을 위해 힘쓰겠다.” 이 한마디에 중국 백성들은 쓰나미가 몰려오는 요동을 쳤다. 조선 백성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안중근은 조선 국경을 넘어 중국을 집어삼켰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행여 수의로 지은 한복이 구겨질까 봐 그 위에 신문지를 덮고 다리미로 폈다. 창자를 도려내는 아픔을 누르며 편지를 쓴다.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슨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가이드 Yemsichan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니?” 즉답이 왔다.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깜놀? 누가 그러더라. 모르면 죄가 될 수도 있다? 깜뿌찌어, 캄푸치아, 캄푸챠, 크마에, 크메르, 캄보디아 부르는 명칭은 달라도 1953년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킬링필드’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겪었지만, 1993년 최초의 선거 때문에 캄보디아왕국이 재수립되고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단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여야만 했던 전쟁과 학살의 땅에서 한 번 더 물었다.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니?” 대한민국이라고 별수 있었더냐. 프놈펜에서 만난 사람들의 겉옷에는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가 달려 있다. 캄보디아 농업연수생이 한국을 가기 위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구겨진 종이를 바르게 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비행기에 오른다. -

- ▲ 프놈펜에서 만난 젊은이들.ⓒ이재룡 칼럼니스트
1964년 서독으로 간다. 의회에서 눈물로 호소한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한국에 제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 역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외화를 모아 고향에 보내려는 젊은이들이 ‘파독’ 근로를 희망했다. 지하 1000m를 내려가 석탄을 캐는 광부였고,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닦여야 했던 간호사가 전부였다. 광부들에게 간호사들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역만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후손을 위해 번영을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난을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에 울었다. 눈이 퉁퉁 붓도록 밤새 울었다. 그랬다. 서독 의회 의원들도 눈물을 훔쳤다.구겨진 종이의 두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과 캄보디아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 꼴값을 떨 필요까지는 없다. 토닥여 주고 보듬어 주고 안고 가야 한다. 구겨진 종이를 던지면 멀리 간다. 반듯한 종이는 던져봐야 곧장 앞에 떨어진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가슴에는 타다 남은 구겨진 종이가 숨겨져 있다.구겨진 종이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으로 간다.2024년 4월 25일.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룡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진 후 벌떡 일어나 구겨진 종이 위에 글을 쓴다.







![[르포]](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thumb/2026/03/03/2026030300026_0_thumb.jpg)